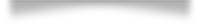새 것이 좋다 새로워서 즐겁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어렸을 때 불렀던 ‘새 신’이라는 동요이다. 그때는 주로 고무신을 신었는데, 찢어지면 꿰매 신고, 밑바닥에 구멍이 나면 장에 가서 때워 신었다. 특히 엄지 발가락 있는 데가 잘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오기 일쑤였다. 어쩌다 새신을 사서 신으면 정말 머리가 하늘에 닿을만큼 신이 났었다.
사람은 위대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찬양한다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주는 반면, 새로운 것은 즐거움을 선사한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사람들은 겨울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겨울에는 새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봄은 온 산야(山野)에 새로움을 풀어 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즐거워한다.
고대 로마의 수사가 L. A. 세네카는 “사람은 위대한 것보다 새로운 것을 찬양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갈망하면서도 오래된 권력은 혐오한다. 지겨움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은 “하찮은 변화라도 단조로움이 지속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낯선 것, 과일처럼 신선한 것을 갈망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도 끊임없이 신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전숙열전(田叔列傳)에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며, 오래도록 부귀를 누리게 되면 화가 쌓여 해독을 끼치고 만다”고 하였다. 요즘 정치인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즐거워하는가? 사람과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새로움에 거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새로움을 갈망하는 시대이다. 지난 세기 말의 화두는 “변해야 산다”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부르짖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마누라와 자식들을 제외하고 모두 바꾸라”고 지시한 모 대기업 회장의 말은 현 시대를 대표한다. 패러다임(paradigm, 어떤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 테두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만들어졌다.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서 부지런한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겨울 양식을 비축한다. 반면에 베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에 양식이 없어서 개미에게 구걸하러 다닌다. 그러나 신세대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는 다르다. 신세대 베짱이는 여름 내내 경치 좋은 곳을 골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음반이 크게 히트하여 떼돈을 벌고 돈방석에 앉는다. 반면에 신세대 개미는 일만하다가 허리를 다쳐 베짱이에게 겨울이 되기 전부터 구걸하러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네오스와 카이노스
희랍어에는 ‘새롭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종류가 있다. 영어 New의 어원인 ‘네오스’(Neos)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카이노스’(Kainos)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눅 5:38)고 하실 때, ‘새 포도주’의 ‘새’는 네오스이고, ‘새 부대’의 ‘새’는 카이노스이다. 이것은 포도주가 시간적으로 최근에 제조된 포도주임을 의미하고, 가죽부대는 질적으로 새 부대 즉 가죽 상태가 온전한 것을 의미한다.
네오스적 새로움은 외형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든지, 새 직장을 얻었다든지, 부자가 되었다든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변화는 순간적인 것이다. 뉴스(News)는 그것을 듣는 순간 이미 새로움이 아니다. 흔히 ‘새 봄’이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봄은 작년에도 있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전 1:10)고 하였다.
이에 비해 카이노스적 새로움은 내적이고 질적인 것이다. 카이노스는 형용사 ‘새로운’이란 공통적인 의미를 넘어 ‘알려지지 않은’, ‘낯선’, 혹은 ‘사용하지 않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낯선 새로움을 의미한다. 새 봄이 왔다고 다 새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있는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새로움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마음에 봄을 지펴라
신라의 고승이요 이두를 창안한 설총의 아버지 원효대사가 구법하기 위해 당나라로 가는 도중, 어느 해안에 이르러 배를 기다리다가 날이 저물고 심한 소나기를 만나 길가 움집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다. 곤히 자다가 목이 말라 머리맡을 더듬어 보니 바가지에 고인 물이 있어 이를 맛있게 마신 후 잠을 계속하였다. 날이 밝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신 물은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었다. 원효대사는 구역질을 하다가 문득 “똑같은 물이었건만 마음에 따라 달고 맛있는 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구역질 나는 물도 될 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로구나” 하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더 이상 당나라에 가서 구법할 필요가 없다 하여 가던 길을 되돌아 와서 이 진리를 중생에게 가르쳤다.
봄은 올해도 어김없이 산야에 새로움을 뿌려놓고 있다. 한자 ‘春’은 풀잎이 따뜻한 봄날의 햇볕을 받아 대지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나타낸다. 같은 풀잎을 보면서도 작년에 보았던 ‘옛싹’을 보는 이도 있고, 낯선 ‘새싹’을 보는 이도 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에 있기 때문이다.
새 봄을 백번 천번 맞더라도 새 봄이 아닌 늘상 맞는 옛 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단 한번이라도 내 마음에 봄을 지펴 새로움을 꽃피워야 진정한 봄을 맞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후 4:16)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늙고, 쇠퇴하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날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박성하 / 로뎀아카데미 원장